얼마 전에 읽은 한 문구가 재미있어서 공유. 출처는 “The Hall of Innovation (혁신의 전당)“이라는 글이다. 1876년, 알렉산더 그래험 벨 (Alexander Graham Bell)이 자신이 만든 전화 특허를 전보(telegraph) 회사에 팔려고 했을 때 그들이 한 말:
The idea of installing ‘telephones’ in every city is idiotic… Why would any person want to use this ungainly and impractical device when he can send a messenger to the telegraph office and have a clear written message sent to any large city in the US? This ‘telephone’ has too many shortcomings to be seriously consider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. The device is inherently of no value to us. (모든 도시에 ‘전화기’라는 걸 설치하겠다는 생각은 말도 안됩니다. 사람을 써서 전보국 가서 전보를 부치면 메시지가 미국의 어느 주요 도시로든 전달될 수 있는데, 도대체 누가 이런 실용성이 없는 장치를 사용하고 싶어하겠습니까? 이 ‘전화기’라는 건 너무 단점이 많아서 도무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. 한마디로,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.)
그들이 쓸모 없다고 단칼에 무시했던 ‘전화’의 가능성을 믿은 벨(Bell)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따서 벨 전화 회사(Bell Telephone Company)를 만들었고, 140년이 지난 지금, 벨의 이름은 ‘전화 발명가중 한 명‘로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다.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보았고, 벨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출처와 함께 관련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.
Bell and his partners, Hubbard and Sanders, offered to sell the patent outright to Western Union for $100,000. The president of Western Union balked, countering that the telephone was nothing but a toy. Two years later, he told colleagues that if he could get the patent for $25 million he would consider it a bargain. By then, the Bell company no longer wanted to sell the patent.[89] Bell’s investors would become millionaires, while he fared well from residuals and at one point had assets of nearly one million dollars.[90](벨과 그의 파트너인 허버드와 샌더스는 이 특허를 웨스턴 유니언에 10만달러에 팔려고 하자 웨스턴 유니언의 회장은 전화기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며 거절했다. 2년 후, 그는 200만달러에 전화기 특허를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했지만 벨은 이미 팔 생각이 없었다. 벨에게 투자한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될 것이었다.)
당시의 웨스턴 유니온 회장이 멍청이라고 비웃을 것인가. 지난번 넥스트 빅 씽(Next Big Thing)이라는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썼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. 당시 전화기는 정말로 누구에게라도 쓸모 없는 장난감으로 보였을 것이다. 짧은 거리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음질도 안좋아서 알아듣기도 힘들고 아직 가격은 비싸서 쉽게 살 수도 없는 그런 물건. 게다가 확성기처럼 생긴 이상한 기계에 입을 대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품위 없어 보였겠는가.

하지만 그 장난감같은 전화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바쳤던 벨은 전혀 다른 상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. 그는, 미국의 모든 집의 마루 한 중심에 자신이 만든 전화기가 놓여 있는 장면을 상상했을 지도 모른다. 어쩌면, 불가피한 이유로 떨어져 살게 된 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상상했을 지도 모르겠다.
한편 아래는, 2001년 애플이 아이팟(iPod)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맥 루머(Macrumors.com) 사이트에 사람들이 올렸던 반응 중의 하나이다 (대부분 부정적이다).
스티브 잡스가 1997년 Think Different 캠페인의 첫 광고에서 썼던 유명한 카피가 떠오른다: “미친 사람들, 부적응자들, 반란자들, 트러블 메이커들, 네모난 구멍에 맞지 않는 동그라미들에게,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. 그들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고, 현상태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. 당신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고, 반대하고, 찬양하거나 악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, 한 가지 할 수 없는건 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. 바로 그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. 그들이 인류를 한 단계 앞으로 진보시킵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볼 뿐이겠지만, 우리에겐 천재로 보입니다.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만이 실제로 세상을 바꿉니다.”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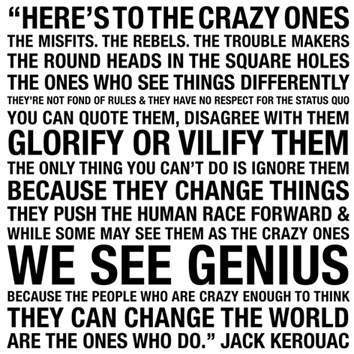
메이커(Maker)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.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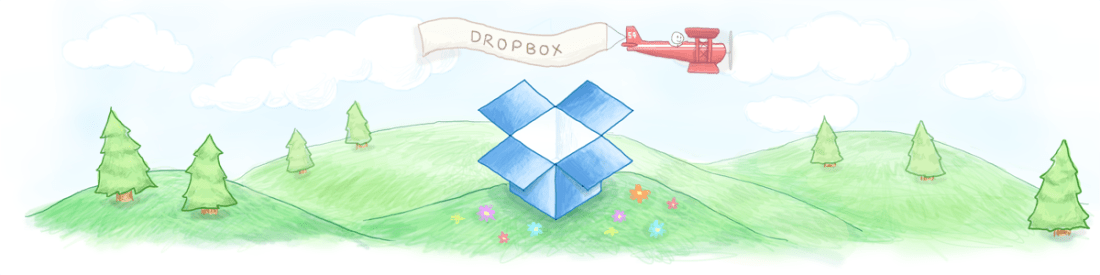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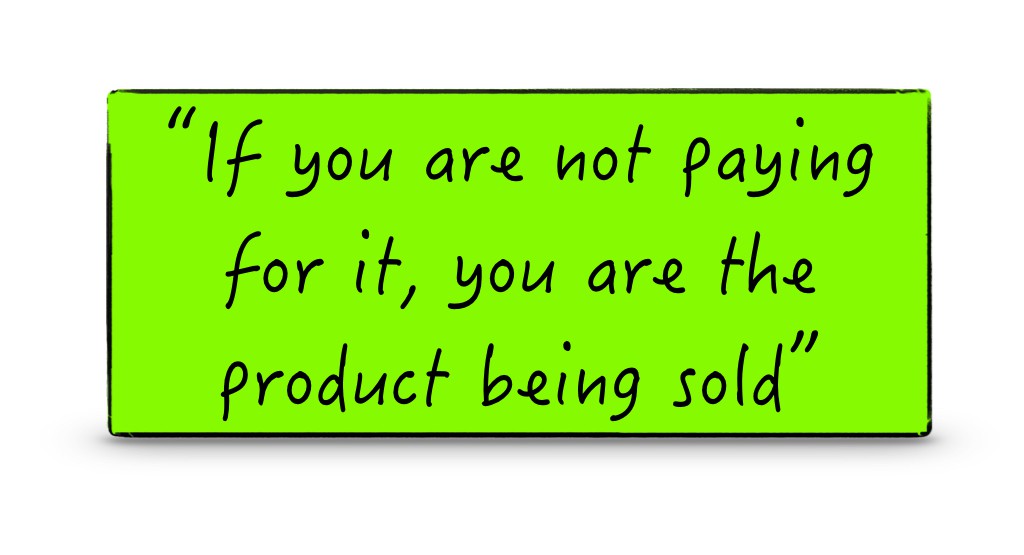





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.